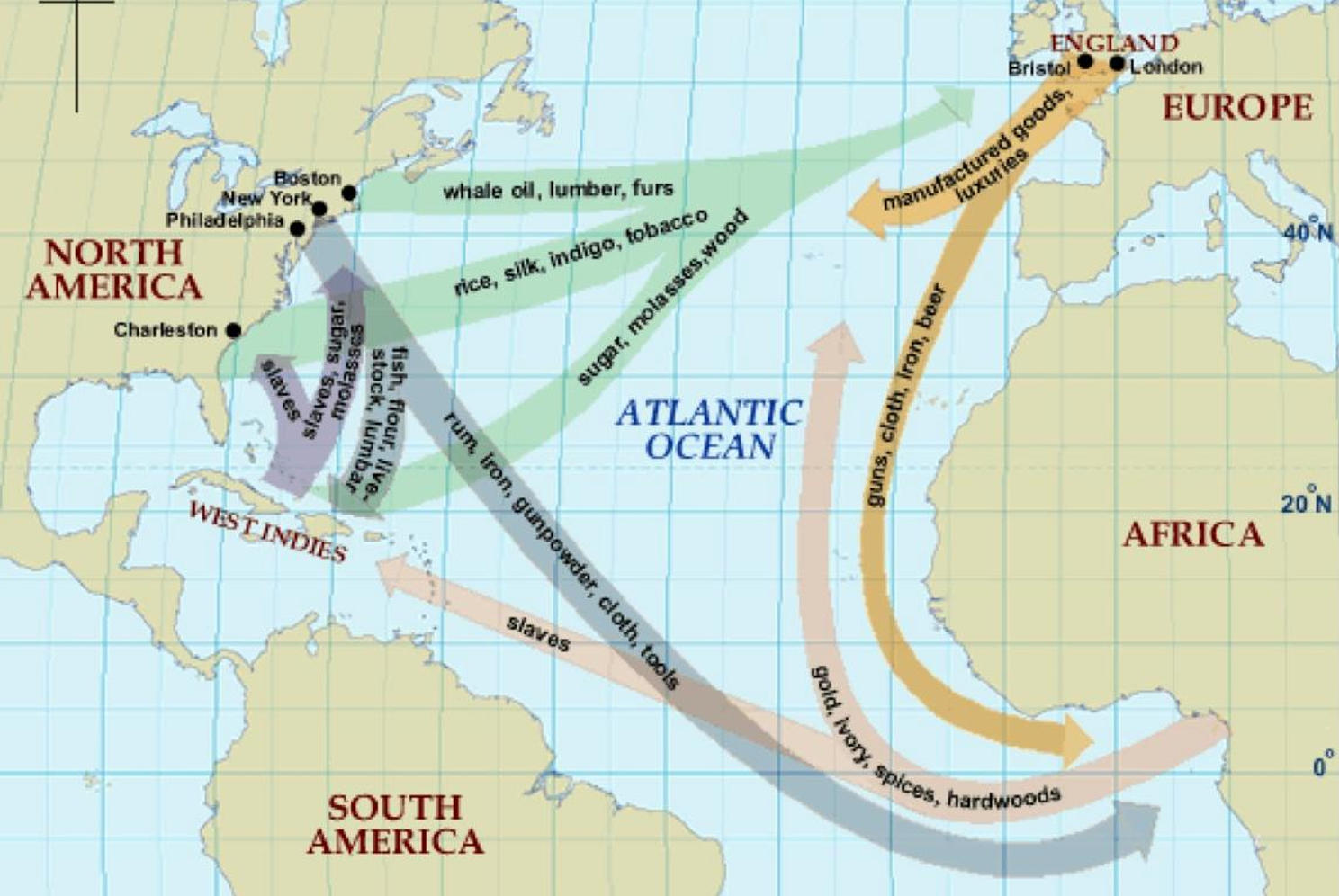- dd(182.224)
- 2019.07.28 15:26
- 조회수 178
- 추천 13
- 댓글 0
바베이도스의 농장주 무리는 브라질의 네덜란드 농장을 방문했다가 흑인 노예 노동력의 이점을 목격하고 깊은 인상을 받았다. 아프리카인은 수천년 동안 기량을 인정받은 농사꾼들이었다.
영국인과 달리 열기에 익숙했으며, 설탕 제도의 사망률에 크게 기여한 황열병과 말라리아에도 강했다. 결국 정복자 영국인이 노예무역에 직접 뛰어들었다. 찰스 2세는 아프리카 무역을 수행할 독접기업을 설립하고 '아프리카행 왕립 모험가들'이라는 화려한 이름을 붙였다.
처음에 흑인 노예 대부분은 노예 상인이 아닌 적대 관계에 있던 부족의 병사들에게 붙들렸다.
하지만 아프리카에 머물렀던 유럽인의 60퍼센트가 첫 해에 사망했으며, 7년째 되던 해에는 80퍼센트가 사망했고, 10년째에는 오로지 10퍼센트만 생존해서 돌아왔다.
유럽인이 직접 아프리카인을 노예로 잡아왔다는 신화가 오랫동안 퍼져 있었다. 열대 질병에 극도로 취약한 선원들 소수가 고국의 지원도 없이 1200만 아프리카인을 납치할 수 있었을리 만무하다. 그럼 누가 납치했을까? 바로 같은 아프리카인이었던 것이다.
노예 무역선에는 위생 시설이나 환기 시설, 무더운 환경에서 쉴 공간이 없었으며 이상태에서 몇 분이나 몇 시간이 아닌 몇 주를 이동했다. 노예들은 자신이 배출한 오물이 흥건한 장소에서 다른 노예와 포개진 상태로 이동했다. 불쾌한 소화기 질환, 사슬과 고정된 자세 때문에 벌어지고 곪은 상처 등 대서양을 횡단하는 노예 무역선의 환경이란 인간의 상상을 초월했다.
1820년 이전에는 대서양을 건넌 인구의 77퍼센트가 흑인 노예였다. 19세기 중반 이후에 노예제도가 불법화되고 나서야 백인이 이주자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1808년 북아메리카 노예의 대다수는 신대륙에서 출생한 인구였으며, 남북전쟁 당시에는 아프리카의 문화를 희미하게 기억하는 정도였다. 반면 카리브제도와 브라질은 아프리카에서 지속적으로 노예를 들여왔다. 신세계 농장 사회의 마지막 보루였던 쿠바에서는 20세기까지도 요루바어가 널리 통용됐으며, 지금도 카리브해 문화에 아프리카의 영향이 깊이 남아 있다.
-
13 고정닉 추천수0
-
0